2026년 요즘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시기에는 “내가 뭘 바꿀 수 있지?”라는 질문이 자주 떠오른다. 바딤 젤란트의 트랜서핑은 그 질문에 꽤 독특한 방식으로 답한다. 세상을 억지로 조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쏟는 에너지와 의식의 방향을 바꾸면 현실이 달라 보이고, 결국 선택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트랜서핑을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고,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감각까지 같이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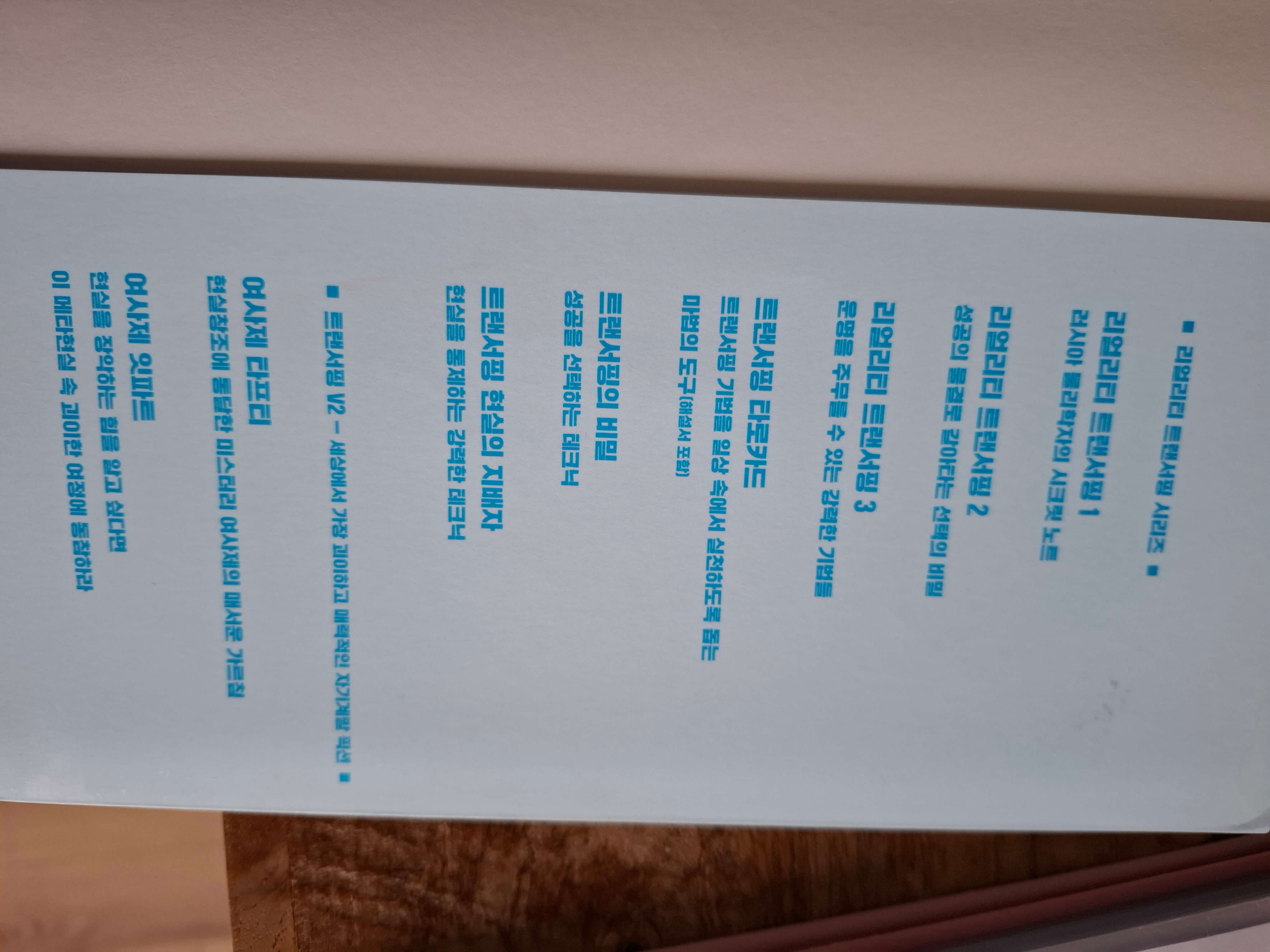
잠재력: “가능성의 공간”을 내 일상으로 끌어오는 법
트랜서핑을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가능성의 공간’이다. 쉽게 말하면, 내 앞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설정이다. 누군가는 이걸 영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심리학적으로 해석한다. 2026년의 현실에서 이 개념이 매력적인 이유는 딱 하나다.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 너무 “정해진 레일” 같기 때문이다. AI 때문에 직업이 바뀐다는 말은 매일 들리고, 경제 뉴스는 불안을 키우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좁아진다. “이거 아니면 끝”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질수록 행동이 굳는다. 나는 남들이 정해 놓은 목표를 맹목적으로 따른다.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이 모두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모두들 서울대를 원하고, 삼성전자 취직을 원한다.
트랜서핑이 말하는 잠재력은 거창한 재능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하루를 사느냐”가 결국 현실의 체감과 결과를 바꾼다는 뜻에 가깝다. 예를 들어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쫓기면 실수가 늘고, 표정이 굳고, 사람과의 대화도 뾰족해진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만 정돈되면 같은 능력이라도 더 매끄럽게 나온다. 이 차이가 쌓이면 1년 뒤의 현실이 달라진다. 가능성의 공간은 그렇게 ‘매일의 상태’로 들어온다. 이러한 재능은 트랜서핑에서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니다. 오래된 책들, 선구자들이 이미 말했던 내용이다. 그 내용을 물리학과 접목시킨 것뿐이다. 저자 바딤 젤란드는 옛 러시아의 물리학자였다. 물리학자가 이런 책을 쓴 것에 대해 나는 적잖이 놀랐다. 2026년식으로 이걸 적용해 보려면 거창한 선언 대신,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선택한 감각”을 만들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아침에 핸드폰부터 열지 않기, 하루의 중요한 일 1개만 먼저 끝내기, 나를 불안하게 하는 계정/커뮤니티를 끊기, 내 속도를 인정하기. 이런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가능성’을 넓히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불안이 줄어들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질수록 선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결국은 자신을 잘 관찰해야 한다. 나의 감정을 잘 읽고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항해를 해 나아가야 한다.
균형: 너무 간절할수록 망가지던 이유를 이해하기
트랜서핑에서 내가 가장 현실적으로 공감했던 부분은 ‘과도한 중요성’을 낮추라는 말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꼭 잡고 싶은 게 생긴다. 승진, 합격, 매출, 연애, 관계 회복…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간절할수록 일이 꼬일 때가 있다. 너무 중요하면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한다. 그때 사람은 흔히 자기 탓을 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트랜서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한다. 중요성을 과하게 주면 긴장이 커지고, 긴장은 판단을 흐리고, 흐려진 판단이 행동을 삐끗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건 2026년에도 그대로 통하는 심리다. 말 그대로 심리이다. 트랜서핑이 어떤 마법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깊은 감정을 잘 읽어 낼 줄 알아야 한다.
균형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내가 목표를 붙잡고 있는지, 목표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목표가 나를 붙잡는 순간부터 삶이 좁아진다. 나 스스로가 삶을 이끄는지,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이끄는지 잘 구분해야 한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결과를 상상하며 불안해지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작은 변수에도 무너진다. 그러면 실력은 그대로인데 컨디션이 무너진다. 트랜서핑이 말하는 균형은 그걸 되돌리는 기술이다. 목표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목표를 ‘내 인생 전부’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솔직히 이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이자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한 것을 버려둔다는 데 있다.
2026년에 균형을 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완충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정표가 빽빽하면 작은 일이 생겨도 바로 무너진다. 반대로 10~20분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나를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유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의 여유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10초만 쉬는 것, 화가 날 때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는 것, 불안할 때 검색을 멈추고 산책을 나가는 것. 이런 행동이 균형을 만든다. 트랜서핑이 말하는 현실 변화는 결국 이런 ‘작은 중단’에서 시작된다.
현실: 2026 트랜서핑을 “생활 기술”로 바꾸는 루틴
트랜서핑을 읽고 감동만 받고 끝나면, 그건 그냥 좋은 문장으로 남는다. 2026년에는 특히 그렇다. 정보가 많아서 감동은 금방 사라지고, 다음 날 또 흔들린다. 그래서 현실로 가져오려면 루틴이 필요하다. 나는 트랜서핑을 “내 에너지와 의식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생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웠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 3분 정렬이다. 일어나자마자 뉴스나 SNS를 보기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적는다. 그리고 그걸 끝냈을 때의 장면을 아주 짧게 떠올린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슬라이드’의 축소판이다. 포인트는 화려한 상상이 아니라 “끝낸 후의 내 표정과 몸”을 느끼는 것이다. 그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편해지는 느낌, ‘됐다’라는 안정감. 그 감각을 먼저 만들어두면 하루가 덜 흔들린다. 두 번째 루틴은 낮의 ‘중요성 체크’다. 일이 꼬일 때마다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된다. “지금 내가 이걸 인생 전부처럼 만들고 있나?” 그렇다면 중요성을 한 단계만 낮춘다. 예를 들어 “오늘 100점이 아니라 70점만 해도 된다”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흐름을 만든다” 같은 문장으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니라, 과열된 상태를 정상 온도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과열이 내려가면 시야가 돌아오고, 시야가 돌아오면 선택이 생긴다. 세 번째 루틴은 저녁의 ‘에너지 회수’다. 하루가 끝났을 때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썼는지 적어보는 것이다. 소모 1개, 회수 1개만 적어도 충분하다. 예: “비교 콘텐츠 30분(소모), 운동 20분(회수)”. 이 기록이 쌓이면 내 패턴이 보인다. 패턴이 보이면 다음 날 선택이 빨라진다. 트랜서핑이 말하는 현실 이동은 결국 ‘선택의 누적’이니까. 2026년의 현실은 통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 하루의 에너지 흐름은 어느 정도 손볼 수 있다. 내가 덜 소모하고, 덜 흔들리고, 더 단단해지면 현실은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다. 트랜서핑은 그걸 꽤 독특한 언어로 말해줄 뿐이다. 트랜서핑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의 문제다. 오늘 하루, 내 에너지를 뺏는 것 한 가지를 줄이고, 내 균형을 되찾는 행동 한 가지를 해보자. 그 작은 선택이 쌓일수록 2026년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조금씩 되찾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